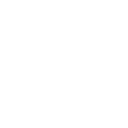|
' 이 이야기는 실제 <<타라 덩컨>>이라는 책을 변형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옮겨 쓰는 것이 아닙니다.'
1화
지하 신전
칠흑같은 어둠이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 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몇 걸음 걷다보면 무언가가 만져지고, 밟혀지고, 부딪혔다. 이 깜깜한 곳에서 허둥지둥 대는 것이 몹시 짜증이 났던지, 론과 해리가 서로 부딪힐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었다. 그 소리를 잠잠코 듣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조용히 해. 여기는 고대 마법사들이 온갖 장치로 덫을 만들었다고. 서로 짜증을 내기만하면 그 소리에 어떤 장치가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너희 둘이 서로 짜증만 낼거야?"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려 몸에 작은 모래들이 들어왔다. 셋은 고개를 치켜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이내 지진이 잠잠해지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거봐, 조용히 해!"
"하지만 헤르미온느. 여긴 너무 어둠컴컴해. 이대로 가다간 숨겨진 덫에 걸려 죽고 말거야!"
"그건 론의 말이 맞아. 자그마한 빛이라도 밝히자고!"
해리가 맞장구를 쳤다. 헤르미온느는 어쩔 수 없이 마법 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지팡이 끝에서 마법 불이 번쩍하며 안을 밝게 비추었다.
"이제야 좋군. 진즉에 마법을 부렸으면 코가 깨지지 않았을 거야."
론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헤르미온느가 지하 신전에 들어가기전에 수많은 마법의 덫이 있어 어떤 마법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서 어둠컴컴한 앞을 걷다가 해리와 론은 꺾어지는 길을 알지못하고 벽에 이마를 박기도 하고, 올라가야 하는 계단의 첫발을 잘못 헛 딛어서 계단 위로 코가 깨졌었다. 둘의 얼굴은 작고 푸른 피벙이 군데군데 나 있었다.
앞으로 가야하는 길을 보고는 그들의 고개가 절로 떨구어졌다. 성인 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벅찬 좁은 통로를 누워서 기어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옷을 잡고 털었던 론이 말했다.
"이렇게 더운데 하필이면 이 좁은 통로를 기어 들어가야 하다니. 헤르미온느,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약이나 마법 없어?"
헤르미온느의 얇은 입술에서 한 숨을 내며 고개를 저었다. 평상시에도 짜증이 나기만 하면 자신에게 버럭 소리 지르던 철 없는 론이었다. 하긴, 론의 마법지팡이는 부러져서 마법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 덜렁대는 터에 마법 지팡이를 식탁 의자 위로 놓지 않았더라면 론의 엄마의 커다란 엉덩이로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들어간 통로 앞에 다시 높은 천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앞장서서 들어간 헤르미온느가 일어서서 마법 지팡이를 휘 저으며 둘러보았다. 해리와 론이 다음으로 나와 일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아야 닿을 수 있던 천장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색채들로 고대 이집트 문장들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헤르미온느가 그림을 대고 말했다.
"이건 아누비스야. 오시리스도 있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그림들은 모두 저승까지 가는 문을 인도하는 하나의 주문서인 거야!"
"대단한데?"
빙그레 웃던 론의 입가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벽에 그려진 그림들에 정신을 빼앗기는 동안, 헤르미온느를 따라 둘려보던 해리가 긴 계단 위로 무언가를 응시했다. 헤르미온느의 팔뚝을 잡고 흔들어 그곳을 가리키며 물었다.
"헤르미온느, 저기 작은 문이있어. 저 문이 우리가 찾고 있는 보물을 숨긴 문일까?"
고개를 치켜 올려보니 화려한 그림들 속에 초라하고 겸손한 작은 문이었다.
"모래 문이라니......,"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갸웃 거리며 앞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을 걸었을까. 조용히 혼자 걷던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비명을 질러댔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밀가루에 맞은 마냥 하얗게 질렸다.
깜짝놀라 헤르미온느에게 달려간 론과 해리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계단 위로, 그리고 그 밑으로 수 많은 인간의 해골들이 산더미로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