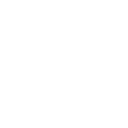|
#3- 1층 PC실..
아르바이트 하는 영미를 빼고는 1층이 텅텅 비어 있었다.
그- '영미야, 니도 하자.'
영미- '뭐하는데요?'
그- '쇼트트랙 서버 다운시키자.'
영미- '(앗싸..) 하자!!!'
둘이서 손발이 척척이다.
잠시 펄펄 끓었던 나는 한 풀 꺾인 채 둘이서 인터넷을 열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미- '언니, 언니는 한국사람 아니에요?'
나- '(어처구니가 없음..) 뭐?'
와... 여기 또 대단한 한국인이 한 명 있다.
마지못해(?) 이미 다운로드가 완료된 컴퓨터들을 붙잡고 일일이 실행시키는 걸 도와주고 있었다.
11대의 PC에서 사이버시위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1분에 200번의 새로고침을 통해.. 서버에 과부하를 걸리게 해서 다운시킨단다.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들일까? 천추에 한이 맺힌 사람들일까?
영미- '됐다. 죽어봐라..'
그- '와....전부 다 동참해야 되는데.. 아 참!! 영미야, 니도 빈라덴 팬클럽에 가입하자.'
영미- '그래!! 하자!!'
그 후.. 둘이서 또 다음까페에 가서 가입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었음..
저런 일에는 일말의 비판도 없이 뭉치는데...
왜 우리의 단결은 이토록 협소할까... 왜 우리는 이런 일에만 분개할까...
예전에.. 정작 우리의 문제인데도 사람들이 무관심함에 절망했었던 일이 스쳤다.
알게 모르게 서글픔이 느껴졌다
그- '(진지해짐) 다른 일에도 이 정도로 열내고, 같이 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 '(조금 놀람..).........'
그- '올라가자'
그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나섰다. 나도 말없이 따라 올라갔다.
#4-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가 대여섯 계단쯤 올라가더니 갑자기 멈춰섰다.
무심코 따라 올라가다가 나도 멈칫, 하고 섰다. 그가 뒤로 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을 뒤로 내밀었다.
나- '????????'
그- '너 지금 기분 안좋지?'
나- '왜요?'
그- '그냥 서운하지?'
나- '뭐가..'
그- '왜 갑자기 조용한데?'
나- '예? 그냥..'
그- '왜 이렇게 사소한 데만 펄펄 날뛸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냐?'
이 남자... 독심술이라도 배웠나?
그- '나도 전에 일본 교과서 왜곡한 것 때문에 사이버시위하는 거 보면서 그런 적 있었다. 서버가 다운되서 정말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럴 때만 이럴까.. 되게 서운했었어.'
나- '예..... 그런 기분이에요.'
그가 두어 칸 계단을 내려와서 내 손을 꼭 잡아 쥐고 앞서서 올라갔다.
오빠도 그런 기분 느껴봤구나... 그런 게 뭔지 아는구나...
잠시나마 내 기분을 이해받음에 그가 또 달라보였다.. ^^;
#5- 사무실
다시 올라와서는 별 말이 없었다.
공연을 끝낸 뒤 느끼는 허탈감 비슷한 것을 우린 가볍게라도 느꼈다고 해야 할까..
7시가 되자 정훈선배가 돌아왔다.. 셋이서 또 쇼트트랙에 대해서 한바탕 기염을 토했다.
다혈질의 정훈선배가 얘기를 하다가 제 풀에 펄펄 날뛴다. ㅋㅋㅋ
저 기세라면 미문화원 점거도 시간문제지 싶을 정도였다.
세상에 저런 우국충정과 민족지사가 또 있을까..
정훈선배가 분이 조금 풀렸나보다.
정훈선배- '이런 데만 우~~ 달려들어서 난리치지 말고, 세상에 달려들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 그렇지 뭐..'
정훈선배- '옛날에 공연중지 당했을 때 거기 있는 몇백명의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나..'
그- '아... 그때..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정훈선배-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나?'
그- '그때 형 울었잖아.'
정훈선배- '니는 안 울었나.'
이런 일과 뭔가 비슷한, 그러나 결과는 달랐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뜬금 없이 동질감이 느껴졌다.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의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늘 생각이 맞지 않아 답답했고, 참고 또 참고 했었는데, 여긴 생각이 달라서 고생을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여태까지는..
내가 가끔씩 나 혼자만 일을 한다고 떼를 쓰듯이 불평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불평조차 못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호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았기 때문에 정훈선배가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선뜻 수락한 것도 생각이 어긋나서 갈등을 빚을 일은 없을 거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게다가 은규오빠 역시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이긴 했지만, 유별난 정훈선배와 무리 없이 일을 할 정도라면 나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여태 그래왔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훈선배- '퇴근하자, 이런 날은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 볼 데가 있다.'
나- '집에 가서 전부다 스포츠 뉴스 보고 또 잠도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자자.'
정훈선배- '어차피 전부다 동인네거리 지나서 갈 거잖아.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가서 영인이하고 너하고 중간에 내려서 집에 가면 되겠네.'
그- '그러자.'
#6- 퇴근 후 택시 안
금새 택시가 잡혔지만, 퇴근시간이라 그런지 길이 좀 막혔다.
정훈선배가 앞에 타고, 나와 은규오빠가 뒤에 나란히 앉았다.
정훈선배가 '아.. 보기 좋네..'라며 놀렸고, 내가 '쫌...'이라고 말을 막았다.
그? 당연히... '그럼 좋지..'라고 대답했음은 물론이다. ^^;
쇼트트랙 얘기는 속 터지니까 그만하자고 사무실에서 결심하고 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쇼트트랙 봤어요?' 라고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으이구...) 동인네거리로 가는 그 짧은 거리를 가면서도 택시 안이 또다시 광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저렇게 손발이 척척 맞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한민족의 저력에 자긍심을 느낀다. ㅋㅋ
#7- 동인네거리. 저녁 8시 10분
나- '선배 잘 가요.. 술 많이 마시지 마..'
택시를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 '한 살 많은 나한테는 존대말 쓰고, 세 살이나 많은 형한테는 낮추고..'
나- '정훈선배는 몇 년이나 봤으니까 그렇죠. 또 높임말 반, 낮춤말 반.. 그렇잖아요.'
그- '언제쯤 되면 나한테도 그럴 수 있을까..'
나- '모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중요하지..'
나- '생각해 볼께요. 반말이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 '그만큼 편하다는 말이잖아.'
나- '편해도 높임말 쓸 수 있어요.'
그가 하하 웃더니, '그래도 예전보다 말은 많이 하니까 다행이다. 예전에는 하도 쌀쌀맞게 굴어서 옆에도 못 가게 하더니만..' 그랬다.
내가 그랬었나?
그래... 그가 나에게 말을 낮춘 지가 한달 정도 밖에 안된다.
그 전에는 그도 나한테 존대말을 썼었다. ㅋㅋㅋ
'영인아', 부르지도 못하고 할 말만 '그랬어요.. 저랬어요.' 했었다.
그- '나.. 너 좋아..'
나- '(뭐야...) 아.. 미치겠네.. 애들도 아니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나면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그럼... 하하하하.. 말하고 나면 이렇게 좋은데..'
그가 내 손을 잡아 자기 코트 주머니 속에 넣고 걷기 시작했다.
내가 손을 빼내려고 하자 그가 더 꼭 쥐더니 아예 깍지를 껴버렸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손에서 땀난다.. ^^;
그- '세상에서 어떤 장갑이 제일 따뜻하게?'
나- '뭐가 제일 따뜻한데요?'
그- '내 손..'
나- '거의 유치함의 극치를 달리시네요.'
그-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싶다.'
나- '오빠, 제발 땅으로 내려와요..'
그- '버스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나- '오늘은 오빠 먼저 들어가세요.'
그- '싫다.'
길이 좀 많이 막혔다. 10분마다 버스가 오는데 저 멀리서 집에 가는 좌석버스가 보였다.
나- '버스 왔다. 가요.'
그가 내 손을 놓지 않는다.
나- '버스 왔어요.'
그- '다음 차 타라..'
나- '(감당이 안됨..) 쫌.........'
그 후... 서너 대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안 놔줌..
나- '아홉시가 다 되가요. 집에 좀 가자.'
그- '버스 끊길려면 멀었다.'
나- '이게 뭐야.. 아무 것도 못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 '그럼 아홉시까지만 기다리고 그때 오는 버스 타고 가.'
나....... 졌다.
나-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하고 그래요?'
그- '지금 같아서는 60이 넘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뜨아.........) 허허허허허...'
9시가 넘어 버스가 왔다.. 거의 한시간 동안이나 버스정류장에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는 손이 저릴 지경이었다.
나- '이제 정말 가야되요. 잘 가요.'
내가 잽싸게 손을 빼고 튀었(?)다. 그가 '어?' 하더니 허탈한 듯 웃었다.
버스에 올라타서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도 손을 흔들더니 내가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고 서 있었다.
곧이어 문자메세지가 온다..
그- '영인아, 잘가 |
|